35년, 삼성라이온즈의 팬으로 살아온 시간
35년. 프로야구가 출범한지 벌써 이런 햇수가 지났다.
프로야구가 생기기 이전 야구는 고교야구였다. 그 이전에도 스타들이 있었겠지만 그즈음 고교야구의 슈퍼스타는 선린상고의 박노준, 김건우, 경북고등학교의 류중일, 문병권이 있었다.
1981년 봉황대기 결승은 아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안다. 저녁시간 공중파에서 경기를 중계했고 시청률은 어떤 인기 드라마보다 높았다.
자, 이런 분위기에서 프로야구라는 게 창단된다. 3S(screen, sports, sex) 정책으로 군부에서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덜 가지게 작당했다는 말도 많았지만 필자는 잘 모르겠다. 야구 볼 것 다 보고 영화 볼 것 다 보고 세 번째 꺼는 기회가 없었지만 데모할 건 다 했으니까.

1982년 프로야구 개막 당시 한국에선 아마추어 대회인 세계야구선수권 대회가 열렸고, 때문에 대다수의 국가 대표 선수들이 프로야구 개막 해에 얼굴을 보일 수 없었다. 하지만 삼성 라이온즈엔 이만수나 이선희를 비롯한 내가 아는 국가 대표 출신의 선수들이 가득했다.
당연히 삼성 라이온즈에 관심이 쏠린 것이 사실이다. 세계야구선수권 대회도 그 유명한 한대화의 석점 홈런으로 우승했고, 개막전과 한국시리즈 마지막 날도 극적인 만루홈런이 터지며 프로야구 흥행에 일조했다. 두 게임 다 삼성이 패자였지만.
필자는 삼성라이온즈와 특이한 인연이 있다. 82년 프로야구 출범 당시 필자는 서울에 사는 초등학생이었고 아버지는 현역 강력계 경찰이었다.
동대문야구장 개막전 시구자는 당시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씨 였고 관람객으로 가장한 수천 명의 사복경찰이(아버지 말씀으론 수백 명이 아니고 분명 수천명이었다.) 경기장 안에 잠복하고 있었다. 아버지도 그 수천 명 중 한 사람이었고 기념품으로 나눠주던 모자를 받아오려 했지만 당시 홈팀인 MBC 청룡의 모자는 바닥나고 삼성 라이온즈의 모자만 남아 그걸 선물로 받았다.

어려서 팀 연고지가 있는 것도 모르고, 삼성에는 워낙 유명선수가 많아 자연 삼성의 팬이 된 것이다. 그리고 20년. 2002년 이승엽과 마해영이 해결해주기 전까지 매년 우울감으로 가을과 겨울을 보냈고 아버지를 원망하기도 했다. 거기까지.

부친에 대한 필자의 원망을 날려버린
마해영의 홈런
(사진: 삼성 라이온즈)
서른 다섯 해를 보내는 동안 8시즌을 우승했고, 포스트시즌에 진출하지 못한 해를 세는 것이 빠를 정도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명문팀이지만 84년도 한국시리즈 파트너로 롯데를 골라 최동원에게 불멸의 전설을 선사한다든가 이만수를 타격 삼관왕 만들어주겠다고 타격왕 경쟁자 롯데 홍문종에게 고의 사구 8개를 내주는 등 찌질한(?) 모습도 많이 보여줘 망신살을 자초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10개 팀으로 발전한 한국 프로야구에서 팀명과 연고지를 그대로 가져가고 있는 팀은 삼성과 롯데, 이 둘 뿐이다. 동시에 양준혁, 이승엽 등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를 배출하고 최근 들어 우승을 밥 먹듯 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다가 요사이 말이 많아졌다. 중심타자 박석민과 나바로가 팀을 떠났고, 도박문제로 마운드의 중심 세 명이 야구판을 뒤집어놨다. 근심과 걱정 속에서 개막 후 열흘을 지켜봤다.

(사진: 삼성 라이온즈)
필자는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했다. 이즈음 읽었던 책 중 저자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목이 <장점과 단점>이라는 단편 소설이 떠올랐다.
남극의 신사 펭귄은 북극에서도 살 수 없단다. 오염이 돼서란다. 영하 40도가 아니면 병이 들 정도로 펭귄은 적응력이 약하다. 예술가에 대한 비유로 쓴 글이지만 난 올 시즌 삼성 라이온즈에 이 이야기를 적용해 보고 싶다.
누구나 인정하듯 그동안 삼성의 전력은 안정적이었다. 동시에 신인이나 2군에 있는 선수들에겐 희망이 없었다. 중요하고 안정적인 선수들이 빠졌지만 새 얼굴들을 볼 수 있었다. 백상원, 김재현 같은 선수들은 못해서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아니다. 새로운 얼굴들이 나타나 포지션에 들어가 활약하는 모습은 신선하다.

(사진: 삼성 라이온즈)
기존의 선수들이 질린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악재를 호기로 활용할 수 있는 류중일 감독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일 듯 하다. 붙박이 선수가 사라져버린 지금의 단점이 새로운 선수들의 경쟁의 장으로 새로이 발돋움할 수 있는 장점으로 기운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구자욱이나 박해민은 어느 구단에 가도 주전을 뛸 만큼 자리를 잡았다.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구자욱은 슬슬 이승엽 뒤를 잇는 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그 자리에 누군가가 뒤를 이어야한다. 일단은 기운이 좋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새로운 얼굴들이 많이 등장하는 만큼 새로운 스타일의 삼성야구가 시작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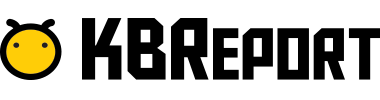
 링크 뉴스
링크 뉴스

